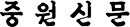21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흔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데 뉴페이스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요즘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기대해도 될지 글쎄. 그동안 내 고향 충주는 낙하산 공천의 연착륙지로 인식돼 고위 관료들의 정치 등용문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고향타령을 무기삼아 거침없이 잡아 삼키듯 승전보를 울린 후 신기루처럼 없어졌다.
고향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있는 곳이야!
김모 전 차관 때문에 충주지역 정가는 때 아닌 고향논쟁으로 시끄럽다. 그는 부친 고향은 김천인데 내 고향은 충주라고 우긴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는 유행가 가사를 즐겨 부를 만큼 충주 유권자들의 민심은 예전과는 달리 녹록치 않다.
툭하면 듣보잡(?)들의 고향팔이로 금의환향했던 배알도 없는 죽은 도시로 불린 충주도 촛불항쟁 이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충주는 더 이상 과거 기득권 토착세력들이 패배주의에 기인에 빌붙어 먹으며 줏대 없이 부화뇌동하던 촌 동네가 아니란 것을 총선 예비후보들은 분명 깨닫기 바란다.
차라리 김모씨는 “내 고향은 경북 김천이지만 유년시절의 꿈과 희망을 키운 천혜의 문화예술도시 충주를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출마키로 했다”고 애써 변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주에도 사람 있는데 부족하면 키워서 인물 만들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25년이 흘렀다. 충주도 숱한 사람이 제도권 안에서 스쳐갔다.
유독 아직까지 건재한 분이 있다. 바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이다.
그분이 출마할 당시에는 이 제도가 막 태어난 갓난 애기 시점이다.
지금은 민주화의 토대위에서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지만 명암은 극명하다.
그분이 멀쩡히 2년 반 이상 남은 시장 임기를 내팽개치고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국회로 진출할 때 무난히 당선시켜준 충주시민들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도지사로 말을 갈아 탈 때도 또 당선시켜 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충주이다.
이처럼 두 번의 보궐선거 실시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재목을 키워 거목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의미도 남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일인 지배 중심의 정치 환경 때문에 지역의 정치신인 배양을 위한 토양 구축이 올바르지 못했다.
또한 입맛대로 정치판을 주무르는 구태의 연속이 가장 큰 폐해로 남아 있다.
충주에는 아직 쓸 만한 일꾼들이 있다. 평생을 민초들과 동고동락하며 울고 웃던 이웃 아저씨가 더 다정다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함께 아파했기 때문이다.
충주는 이제 주인 없는 버려진 땅이 아닌 깨어 숨 쉬는 일꾼들이 주인임을 자부하는 꿈과 희망이 샘솟는 역동하는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