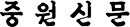'식구(食口)'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민족의 유산이자 전통이고 개념이다. 오늘날 진정 옛날과 같은 가족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식구'란 게 있기는 할까?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family)이다.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familia)에서 왔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일가(一家)', 일본은 '가족(家族)'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구(食口)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 왔다. '같이 밥 먹는 입'이란 뜻으로,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한솥 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식구'라고 말한다.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요즈음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들이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머리뿐인데, 오늘 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출근시간, 자식의 등교시간이 다르다보니, 각자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우유 한잔 서서 마시고 나가기 일쑤고, 저녁 귀가시간도 각자 달라 저녁식사를 한 식탁에서 하기는 커녕 언제 귀가했는지 서로 모르고 각자 방에서 잠자기 바쁘다.
이러한 일상의 연속이니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얼굴 못 볼 때도 허다하다.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늦게 귀가하는 '식구'를 위해 아랫목이나 장롱의 이불 속에 밥을 묻어 두곤 했다. 밥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뜨끈한 국과 따뜻한 밥을 챙겨 주셨다.
그러나 요즈음은 전기밥솥이 그 자리에 대신 놓여 있고, 라면 등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제품이 집집마다 있어 필요할 때면, 밤중에라도 각자 알아서 처리하게끔, 너무도 친절하게 배려되어 있다.
요즈음, 밤늦게 들어와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고 했다간 이 시간까지 밥도 못먹고 어딜 돌아 다녔느냐고 핀잔 듣기 십상이다. 느닷없이 소낙비 오는 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언제 올 줄도 모르는 '식구'를 기다리는 그 많은 모습들을 요사이도 볼 수가 있는가?
누가 말했던가? 오늘날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버지는 직업형편상 귀가하는 시간이 대체로 늦다. 그래서 '식구'들이 가장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자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아이들이 깨어 있더라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제 방에서 건성으로 인사만 건넨다. 그러니 밥상머리 교육이나 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나아가 얼굴은 자주 못 보더라도 서로 각자의 시간과 생활은 간섭이나 침범을 하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집안 분위기를 냉각시킨다.
평소 눈길 한번 준 일 없던 애완견만이 한 밤중에 귀가를 반갑게 맞아주는 쓸쓸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온다.
시대와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이 결혼으로 분가하기 까지는 가급적 '식구'들과 지지고 볶는 생활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식구'이며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
'식구(食口)'란 정겨운 단어가 그립고, 어릴 때 빙 둘러앉아 함께 했던 밥상이 정말 그립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가족, 형제, 친구, 동료만한 보약이 없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