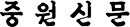“악취가 나는데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5분 서울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50대 남성 김모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콜중독·독거·지병 등의 이유로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달에 1번 안부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고독사가 아니고 병사라고 했다. 관계법령에 ‘주기적 모니터링’은 사회적 교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 시간 뒤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에 따른 고독사 예방활동을 주변 사람과의 교류로 볼 순 없다고 지적한다. 김씨의 경우 외부와 고립돼 살다가 사망한 지 5일 뒤쯤 발견된 전형적인 ‘고독사’이다. 1달에 1번 전화했다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쌓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준이 모호해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집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만 한 해 500건 이상 고독사가 일반병사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숨진 뒤 사흘 넘게 지나 시신이 발견된 경우 고독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 간 서울시에서 자체 판단한 고독사는 연평균 65.3건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고독사는 연평균 572건이다.
부산시 역시 연평균 19.3건으로 복지부(연 299.3건)보다 280건 적었다. 2021년만 보면 부산시 집계(14건)는 복지부(329건)와 315건, 즉 22.5배나 차이 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부산시 관계자는 “고독사 집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고독사위험군을 방치하는 건 아니다”며 “체계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지자체 고독사 분류는 경찰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시신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아 사망자의 정보 등을 종합해, ‘사회적 고립 상태’를 따진 뒤 고독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 사이에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장에선 ‘동거고독사’에 대해서도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 왜 고독사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 고독사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동거고독사도 인정된다. 고독사 정의도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바뀌었다.
‘시신 발견 시점’ 기준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 부산에선 사망한 지 3일 이후, 전북, 전남 등은 사망한 지 5일 이후에 발견돼야 고독사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정모(74)씨는 지난 14일 서울 청파동 노인고시원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사망 추정시점이 3일 전이라 고독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은 고령·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군관리 부담이 늘어난 걸 원인으로 지적했다. 위험군 10명 중 3~4명은 ‘내가 왜 위험군이냐’며 모니터링 자체를 거부한다. 전화를 하면 핀잔까지 듣는다. 그리고 고독사하면 손가락질만 받게 된다는 하소연이다.
고독사 위험군 1000여명에 담당자는 고작 8명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현재 사망자 100명당 1.1명인 고독사를 20% 줄이겠다고 목표를 내건 데 대한 불만도 크다.
복지시스템 전반이 개선되어야 고독사가 줄 텐데 수치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목표를 맞추려고 고독사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늘 것이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만큼 예방 우수사례가 먼저이다 보니 집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정확한 고독사 실태 파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고독사다 아니다. 책임소재를 따질 게 아니라 고독사가 왜?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