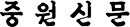"몇 시에 갈까요?" 언제부터인가 명절 때면 으레 들려오는 질문이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섭섭하고 슬슬 부아가 치밀기 시작한다.
"아니 시집 온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이어야 한단 말인가?" 요 근래 몇 년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몇 시까지가? 하면서 마치 와 주는걸. 큰 생색이라도 내는 것처럼 타진한다.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님 이번엔 뭐하세요?" 아들과 달리 상냥하게, 많이 염려해 주는 척, 하는 것이 조금은 서운하다.
그러면 속으로 ‘넌 언제까지 손님이니?’ 하면서 구시렁거린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언제나 "너히들, 맘대로 오고 싶을 때 오렴"이다.
집안 일 이란 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티가 안 나는 밑 작업이 많아서 식구 끼리 식사 한번 하려도 여간 분주한 게 아니다.
아들 내외가 와서 도와준대도 고작 준비 다 해 놓은 전을 부치거나 식사 후 설거지 정도인데도 나름 부담스러운가 보다.
허긴 시댁이란 말만 들어도 가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 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섭섭한 건 시어머니의 심술일까?
나도 젊었을 때 아이 둘 데리고 버스타고, 기차타고 시댁에 가면, 하는 일 없어도 몹시 피곤하긴 했었다.
작은 문틈으로 이제나 저제나 밖에만 내다보시다 대문에 들어서는 우리가 보이면, 시아버님은 "온다, 온다"하시며 기뻐 하셨다.
얼른 절을 하고 부엌으로 나가 무얼 할지 몰라 어물쩡거리면 우리 시어머니 "너는 언제 졸업할래?“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던 때도 있었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하는 일마다 속으로 삭이며 갈등하는 것이 일상인가 보다.
나이 육십이 넘어서야 시댁이 편안해 지고 내 식구처럼 느껴지는데 아직 십년 밖에 안 된 며느리가 뭐 그리 편안 할까 생각 하면, 스스로 이해가 된다.
식사 시간이 딱 되어 들어와서 "어머니 뭐~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며 분주히 거드는 며느리 보면 내가 언제 그런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게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요즘 젊은 새댁들은 시집에 가서 일 하는 게 부담스러워 멀쩡한 팔 다리에 깁스까지 하고 간다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며느리는 넘치지, 하면서 만족하며 지낸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도 시어머니 들은, ‘지금 며느리들은 참 편한 거야’ 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또 그 시절처럼 같은 말이 오간다.
앞으로도 아마 같지 않을까? 어차피 맺어진 인연, 살뜰히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야지, 서로 할퀴며 다투고 흠집 내며 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그래, 내 자식들 편하게 내가 아직 힘 있을 때 기쁘게 더 하지 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겠다.
“며늘아기야! 시간 맞춰 안와도 좋으니 오늘의 나를 기억 하여 주고, 내 아들과 나 때문에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주렴 사랑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