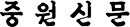지난 11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두고 엘리트주의에 매몰된 천민민주주의 또는 관료사회의 오만함과 선민의식의 표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평소 민중을 개.돼지로 여겼기 보다 민중을 개.돼지로 여겨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설가 조정래는 “국민이 개.돼지라면 그 개.돼지들이 낸 세금으로 살아온 그는 기생충이나 진딧물”이라고 대응하였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새겨보면, ‘개.돼지’라는 말은 정당하지 않은 욕심을 내세우거나 은혜와 고통을 쉽게 망각하는 무지몽매한 존재를, 그리고 ‘기생충’은 이들에게 달라붙어 살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보다는 몽매함을 지속시키며 자신들의 생존과 영화를 추구하려는 존재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말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로 시작되면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였고, 이후 ‘협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협치’는 당.정.청 및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내지 협력을 지향하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본래 ‘협치’라는 용어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일본 학계의 번역이기도 하다.
협치가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국가중심 통치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형성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환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새로운 통치형태이다.
거버넌스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와 공생산(co-work)을 대표적 형태로 한다. 따라서 민.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거버넌스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서로를 개.돼지나 기생충으로 인식해서는 거버넌스는커녕 협력지향통치(?)마저도 불가능하다.
한국의 관료문화는 조선시대 양반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 관료사회, 일제 헌병과 경찰 통치 그리고 군사정권을 겪어오면서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언제나 권력의 측근, 기반 또는 수족으로 존재해 왔다.
더욱이 정권의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독재성향이 강할수록 정부의 부패는 더 심각하였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들의 부패를 척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도 결국 이들 스스로가 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문민정부 초기의 공무원 사정과 부패척결은 복지부동이라는 관료집단의 저항적 행태를 초래하였고 끝내 문민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강조되어왔다. 이는 국가관료 중심 통치의 문제점에서 빗어진 거대정부와 경직된 시스템,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간직한 채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거버넌스 체제로 이끌 것인가?
우리의 시민사회는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공익보다는 눈앞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더 많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집단의 형성도 부족하다. 결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은 물론 그 토대인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마저도 공직사회가 앞서 진행해야할 몫이 되고 있다. 어쨌든 아직까지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집단이 공무원이고 그것이 국민이 그들을 고용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벗고,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한 때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던 존재를 탈피하고, 산업화시대 경제건설의 주역이었던 것 보다 더 바람직하고 보람된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